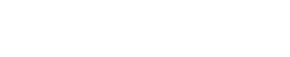BNX Market News【Week 38】
Page Info
Writer BNX Date25-09-22 18:51 View485Times Reply0link
Content

‘유럽 두자릿수 급락’ 컨운임지수 넉달만에 1300선으로 후퇴
북미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항로에서 운임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넉 달 만에 1300선까지 밀려났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9월12일자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398.11을 기록, 전주 1444.44와 비교해 3.2%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다. 북미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항로에서 운임이 떨어졌다. 해양진흥공사는 “북미항로 운임은 상승하고 유럽은 하락하면서 전주와 유사와 구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구간별 운임은 상하이발 북유럽행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TEU) 기준 전주 1315달러에서 12.2% 하락한 1154달러, 지중해행은 1971달러에서 11.8% 내린 1738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북유럽은 7주 연속, 지중해는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상하이발 중동(두바이)행 운임은 전주 1519달러에서 16.2% 떨어진 1273달러, 호주(멜버른)행은 1313달러에서 4.1% 내린 1259달러, 남미 서안(만사니요)은 2363달러에서 23.8% 하락한 1801달러, 남미 동안(산투스)은 3199달러에서 5.7% 내린 3018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 밖에 동아프리카(몸바사)와 서아프리카(라고스), 남아프리카(더반)도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2517달러 3934달러 2977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40피트 컨테이너(FEU)당 상하이발 북미 서안행은 2370달러, 동안행은 3307달러를 기록, 전주 2189달러 3073달러와 비교해 8.3% 7.6% 각각 인상됐다. 서안과 동안 모두 운임이 3주 연속 상승했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싱가포르)는 419달러에서 소폭 인상된 420달러를 기록했다.
한국발 해상운임(KCCI)은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9월15일 현재 KCCI는 1915로, 전주 1950과 비교해 1.8% 하락했다.
FEU 기준 한국발 유럽행 운임은 전주 2545달러에서 7.1% 내린 2364달러, 지중해행은 2813달러에서 3.7% 하락한 271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또 한국발 중동행과 남미 서안행은 전주 2333달러 3051달러에서 1.3% 7.4% 각각 떨어진 2302달러 2826달러였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와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도 전주와 비교해 2.4% 3.3% 1.7% 하락한 896달러 4032달러 3937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북미 서안행은 전주 2253달러에서 1.9% 상승한 2296달러, 북미 동안행은 3224달러에서 1.4% 인상된 3268달러, 호주행은 2489달러에서 소폭 오른 2496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09.18.2025>
亞 - 북미 수출항로, 8월 컨화물 운송량 4% 증가한 186만TEU 기록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미국 데카르트데이터마인이 발표한 8월 아시아 10개국 지역발 미국향(북미 수출항로)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186.3만TEU로 2개월 연속 전년을 웃돌았다. 8월로서는 역대 최다였다. 주력인 중국발은 6% 감소했지만, 5월과 6월의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가 이어졌다. 중국에서의 출하 이동으로 2위 베트남을 비롯 동남아시아와 인도발은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전세계발 미국향은 전년 동월대비 4% 증가한 254만TEU였다. 5월과 6월은 미중 관세 보복 영향으로 중국발이 20% 이상 크게 감소했고, 전체적으로도 2개월 연속 10% 감소로 부진했다. 그후는 7월에 한달 실적으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8월도 동월 최다로 회복세가 이어졌다.
8월 북미 수출항로 물동량을 국가・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99.5만TEU였다. 2위 이하는 베트남이 40% 증가한 26.1만TEU, 한국은 10% 감소한 19.1만TEU, 인도가 33% 증가한 9만TEU, 싱가포르가 21% 증가한 8.3만TEU였다. 인도, 동남아시아의 호조가 이어졌다.
6위 이하는 대만이 3% 감소한 7.2만TEU, 태국은 16% 증가한 6.2만TEU였다. 스리랑카가 70% 증가한 3.8만TEU로 8위로 부상했다. 말레이시아는 2배 증가한 3.8만TEU였다. 일본은 7% 감소한 3.3만TEU로 10위로 밀려났다.
품목별에서는, 1위 가구류가 5% 증가한 28만TEU, 플라스틱이 15% 증가한 19.4만TEU, 기계류가 3% 증가한 19.3만TEU로 상위 3개 품목이 전년을 웃돌았다. 전자전기는 3% 감소한 16.4만TEU, 완구・운동기구가 7% 감소한 12.1만TEU, 자동차 관련이 4% 감소한 9.8만TEU였다.
아시아 10개국 지역발 미국향 1 – 8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363만TEU였다. 중국이 5% 감소했으나,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전년을 웃돌았다. 2위 베트남이 36% 증가, 4위 인도와 7위 태국이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발은 4% 증가한 1903만TEU였다.
미국발 아시아 10개국 지역향(북미 수입항로)의 7월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48.9만TEU였다. 국가, 지역별에서는 중국향이 42% 감소한 6.9만TEU로 크게 감소했으나 1위를 유지했다. 2위 이하는 인도가 24% 증가한 6.6만TEU, 베트남이 94% 증가한 6.2만TEU, 일본은 12% 증가한 5.9만TEU, 한국이 15% 감소한 5.5만TEU였다. 대만은 73% 증가한 5만TEU였다.
품목별에서는 펄프, 폐지가 16% 증가한 7.9만TEU, 플라스틱이 5% 증가한 4.9만TEU, 목초, 콩류가 2% 증가한 4.4만TEU였다.
이 통계는 모선 선적지 기준, 만재 컨테이너가 대상이며, FROB(미국을 경유하는 제3국향 화물)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출처: 쉬핑뉴스넷 09.18.2025>
한·미 관세협상 교착상태, 탈출구는 없나?
지난 7월 30일에 잠정 합의했던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25% 대신 15%로 관세를 낮추는 합의안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일본과 합의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무리한 내용이 많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안은 돈을 내는 사람과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크게 달라 ‘백지위임’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한국 측 입장으로 해석된다.
미·일 합의 내용을 뜯어보니
일본은 미국과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을까? 미국 측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를 짚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월 4일 서명된 것으로 알려진 ‘양해각서’는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창한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로 요약된다.
일본은 경제 및 국가안보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의약품,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포함),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에 투자한다고 명확하게 그 분야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 대한 미국과 일본 간 동맹협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기업이 돈과 기술, 그리고 인력을 교류하고 힘을 합한다면 투자액보다 더 큰 이익이 양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비전이 엿보인다.
투자이행 완료 일자까지 못 박아
또한 투자 약속만 하고 그 이행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미국 측은 문서에 담았다.
미국이 주장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를 정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명한 날부터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해 오는 2029년 1월 19일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특정 날짜를 명시한 점이 이채롭다. 트럼프 임기(4년)가 2029년 1월 20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투자 검토와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되어 3년에 걸쳐 모든 투자가 이행되는 셈이다.
한국 측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증이나 대출이 아니라 전액이 투자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매년 1833억 달러를 일본은 미국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152억 달러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수치다.
양해각서에는 보다 세부적인 실행 장치도 언급되어 있다.
우선, 미국 대통령이 투자분야를 정하면 실제 투자를 실행시키기 위한 투자위원회도 동시에 설치된다. 그 위원장은 미국의 상무장관이 맡는다.
투자분야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관련 위원회도 구성된다. 흔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언급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도 미국 상무부 내에 자리를 잡아 실무적인 투자 절차를 처리한다.
이런 조직과 함께 돈을 입금해야 하는 데드라인도 확실하게 못 박았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분야를 선정했다고 일본에 통지하면 미국 계좌에 4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거의 차용증서의 채무 및 이자 상환 절차를 규정한 것과 엇비슷해 보인다.
과연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
이 대목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얼핏 봐도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조건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금액이 절대적으로 엄청나고 이행 기간도 생각보다 짧다.
보통 해외투자를 위해 수년간 타당성 검토와 현지 조사를 진행함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투자분야가 특정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일본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점 차원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업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트럼프의 ‘Think Big(파이 키우기)’ 협상 전략을 일본이 역이용하여 일본 산업의 글로벌 차원의 업그레이드를 미국의 기업 및 시장, 그리고 연구시설을 활용해 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Think Big’ 전략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분야가 바로 ‘Think Big’ 전략이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점프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이 스스로라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이고 그것을 미국과 협력한다면 양측에 분명하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Think Big을 시현할 새로운 테마나 비전을 3500억 달러 투자에 녹여내야 한다.
한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롭고 폭넓은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구도전환과 함께 투자분야에 대한 기술 및 인력교류 강화, 그리고 기업들의 이해와 미래기술 선점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
이밖에 미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09.19.2025>
인도 상공부 장관, 내일 美 방문해 무역 협상…"조기타결 목표"
인도 상공부 장관이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자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워싱턴을 찾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대표단은 서로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끈 미국 대표단은 지난 16일 인도 뉴델리를 찾아 라제시 아그라왈 수석협상관을 비롯한 인도 대표단과 만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무역 협상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무역 상대국과 제3국의 관계를 무역 협상에서 다루는 이례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당시 협상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보복성' 25% 추가 관세를 철회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인도 대표단은 25% 추가 관세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최근 인도에서 연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일 계획이 없고, 인도 정부도 구매 축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미국 대표단과 최근 뉴델리에서 협상이 끝난 뒤 "(논의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지만,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를 추가로 인도에 부과했다.
50% 관세는 미국이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최고 수준이며 브라질에 매긴 관세와 같다.
인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7월 80억1천만 달러(약 11조2천억원)에서 8월 68억6천만 달러(약 9조6천억원)로 11억5천만 달러(약 1조6천억원)가량 줄었다.
인도 수출업체들은 50% 관세가 적용된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연합뉴스 09.21.2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